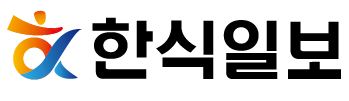한식 발효의 정수를 논함에 있어 김치를 빼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접하는 붉은 배추김치의 모습이 완성되기까지는 단순한 조리법의 축적을 넘어선, 수백 년의 시간과 경험이 오롯이 추적된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 김치의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문왕의 혼례 폐백품에도 젓갈과 채소 절임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이미 염장과 저장을 통한 식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려시대로 들어서면서 김치는 ‘침채(沈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형태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순무, 외, 파, 박, 아욱 등 다양한 채소를 절여 보관했던 방식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존의 목적을 넘어 계절의 흐름과 식재료의 순환을 반영한 삶의 방식이었다. 특히 “순무를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매우 좋고, 소금에 절이면 겨울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구절은 조선 이전에도 김치가 사계절을 버티는 생존 음식으로 존재했음을 잘 드러낸다. 지금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김치를 ‘지’라 부르며, 무나 배추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짠’지 문화가 남아있는것도 이러한 유산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치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했다. 17세기 장계향의 『음식디미방』에는 동아와 산갓, 무, 가지, 오이 등 각종 채소를 절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친 뒤 장이나 젓국에 담그는 방식이 등장하며, 특히 생선이나 젓갈 등 동물성 재료가 첨가되기 시작하면서 김치의 풍미와 보존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후기 실학자 ‘홍만선’의 『증보산림경제』에 채소를 소금이나 식초에 절이고, 생선을 쌀과 함께 삭힌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김치와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식해의 기원과도 연결된다. 함경도의 가자미식해나 영덕의 홍치(횟대)를 사용한 밥식해처럼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한 식해는, 소금이 귀했던 지역에서 곡물을 활용해 발효를 유도한 우리선조들의 지혜였다.
김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고추의 도입이다. 18세기 후반,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확산된 고추는 점차 조리재료로 자리 잡으며, 고춧가루를 넣어 담근 김치가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조선후기 서울의 생활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도잡지』 에는 고춧가루는 물론 새우젓 국물, 해산물, 마늘 등을 활용한 오늘날의 김치 형태가 뚜렷이 확인되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배추김치의 원형을 이 시기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고춧가루의 사용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요소를 넘어, 당시 급등한 소금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능하여 고춧가루가 젓갈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산화를 막으며, 동시에 매운맛으로 만족감을 채워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일종의 경제적 대안이 되기도 하였다.
김치의 발효는 미생물과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김장을 담그는 순간부터 류코노스토크 메센테로이데스라는 유산균이 작용하여 당분을 젖산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ph가 낮아지며 잡균의 번식의 억제되므로 이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같은 유산균이 뒤를 이어 활동하면서 김치는 점점 더 깊고 안정된 발효단계로 진입한다. 조선시대『동국세시기』에 “찬 곳에 김치를 두어야 맛이 좋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낮은 온도에서 유산균이 천천히 작용해 산미와 아삭한 식감을 유지한다는 과학적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우리는 김치가 당연히 붉고 매운 음식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지혜와 실험,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깊은 철학이 깃들어 있다. 김치는 단지 발효음식이라는 범주를 넘어선, 계절을 저장하고 공동체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건강식품으로 자리잡아 유산균 음료보다 100배가 넘는 유산균을 함유한 김치는 렌틸콩, 올리브유, 그릭요거트, 낫토와 함께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 과학적, 문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김치 한 접시는 곧, 시간의 발효이자 지혜의 결정체이다.
천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김치에는, 단지 맛을 넘어서 생존과 순환, 그리고 조화라는 삶의 원리가 담겨있기도 하다. 그 찰나의 한 젓가락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먹고 자연을 품으며,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간다.
△ 안미정 한국발효식문화협회이사
現 한국발효식문화협회 이사 (2024. 3 ~ )
現 한식대가 선정 (대한민국한식포럼) (2021. 7. 1 ~ )
現 제35회 신지식인 선정 (한국신지식인협회) (20. 7. 1 ~ )
現 수산물식품조리명인 (한국조리협회) (2019. 11. 3 ~ )
現 한국조립협회 상임이사 (2019. 3 ~ )
現 성림 대표 (2016. 7 ~ )
現 통영음식연구소 대표 (2020. 2. 26 ~)
前 한국치유음식진흥원 부회장 역임 (2020)
前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심사위원 (2019)
前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대회 심사위원 (2019)